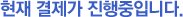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비단은 오백 년을 가고 종이는 천 년을 간다 타이틀 이미지]()
한지 이야기 #1.
비단은 오백 년을 가고 종이는 천 년을 간다
한지 이야기 #1.
비단은 오백 년을 가고 종이는 천 년을 간다
중국 북경의 중심인 자금성에 우리 한국의 한지가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이곳의 모든 벽과 문에는 한지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한지가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지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면서, 종이로서의 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한지와 관련된 재밌는 설화와 제작 방식 등 한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닥나무 지팡이, 한지가 되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라시대,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뒷산 국사봉에 대동사(大同寺)라는 절에 설 씨(薛氏) 성을 가진 주지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절 주변에는 닥나무가 많이 자생했는데, 하루는 이 주지승이 반석에 앉아 쉬다가, 닥나무를 꺾어 만든 지팡이를 깜박 잊고 두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와서 봤더니 닥나무의 껍질이 반석에 말라붙어 얇은 막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본 주지승은 이번에는 일부러 닥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돌로 짓이겨 반석에 늘어놓고 다음날 다시 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껍질 역시 엉겨 붙어서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주지승은 이를 발전시켜 한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설화가 이어져 내려온 까닭인지, 아직까지도 의령 사람들은 한지 제조의 기원이 의령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지가 오래간다는 사실은 우리의 문화재를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통일 신라의 우수한 목판술과 더불어 한지의 제작 기술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불교의 경전 중 하나로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불국사가 창건된 8세기 중반 이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지가 천 년 이상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11세기에 들어서면서 확대된 불경 조판 사업으로 종이 생산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고, 국가에서도 이들 종이 생산 기술자들을 지장이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일의 종이로 선호하는 고려지는 이 때 형성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종이 생산 기술은 중요한 국가 수공업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조지서라는 기구를 설치해 종이 생산을 담당케 하였고, 이러한 기틀 위에서 중앙과 각 지방의 종이 생산 기술자들은 수많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우수한 종류의 종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종이 생산 재료 및 기술을 들여와 우리 역사 속에 축적된 기술과 외래 기술을 바탕으로 한층 더 높은 우리만의 종이 생산 기술로 발전시켜 우리 종이의 우수함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지와 양지의 차이점
한지 제작 과정
ⓒ원주시
제조 과정 면에서 우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지의 경우 주원료인 닥나무를 거두고 껍질을 벗겨 백피를 만듭니다. 이를 잿물로 증해한 뒤에 물에 씻어 평평한 돌 위에 놓고 방망이로 두들깁니다. 그러고 나서 해리한 섬유를 닥풀과 함께 지통에 넣고 외발 틀로 떠서 말리고 도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양지는 먼저 원료를 마루 비터로 고해한 후 지통에 넣습니다. 지통에서 일정량의 펄프를 퍼내어 제지틀 속으로 붓습니다. 몇 번 휘저어 준 후 콕을 뽑으면 섬유는 망에 걸리고 물은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젖은 종이는 물에 적신 펠트 위에 엎어 쌓아 놓습니다. 100장 정도 쌓이면 젖은 종이 더미에 압력을 가하여 물기를 뺍니다. 이렇게 압축한 종이를 한 장 한 장 떼어서 건조실에서 말리고 마무리 과정으로 사이징 처리가 필요하면 종이를 젤라틴 용액이 든 통에 담갔다가 다시 건조합니다.
이렇게 한지는 원료와 제조 과정에서 양지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한지의 독특한 장점을 형성합니다. 질기고 강하다는 한지의 특성은 닥나무 인피 섬유에서 나아가 여러 제조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화됩니다. 원료를 삶을 때 잿물을 쓰면 종이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내구성과 보존성이 월등한 종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지는 최대 보존 기간이 200년 정도이나 한지는 1,000년이 넘어도 그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우연한 접힘, 강인함과 먹물에 대한 발묵 현상이 뛰어나고 모든 색상을 재현할 수 있으며 빠르게 흡수되고 방음성과 계절에 따른 방한성과 보온성 등이 양지보다 뛰어납니다.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 다빈치 / 카르툴라, 성 프란테스코
ⓒitalymagazine / ⓒ국가유산청
다빈치의 역작이라 불리는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 그리고 가톨릭의 성인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카르툴라' 등 이탈리아의 문화재를 한지로 복원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학계에서는 한지를 이용한 복원 작업에 굉장히 만족했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탈리아는 자국에서 생산한 종이 외에는 일본의 전통 종이인 화지를 주요 사용하여 복원 작업을 진행했지만, 2020년 8월 이탈리아 정부는 한지를 공식적으로 보존 복원 용지로 인증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복원 적합도 검사는 유럽에서도 매우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화지에 비해 한지는 치수 안정성, 장력, 복원성과 보존력 등이 월등합니다. 화지가 화학 잿물을 사용하여 내외부적 영향으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쉽게 나빠져 빠르게 망가지는 것에 비하여, 한지는 콩대나 메밀대 등 자연 잿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복원 검사를 통해 일본의 화지보다 한지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인도,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 한지를 구하기 위해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국내 한지 산업이 전 세계로 나아가 세계 곳곳의 유명한 작품과 문화재 속에서 한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의 확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한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지승공예(종이를 꼬아 엮어서 그릇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던 조선시대의 공예)를 통해 소반, 등잔대, 반짇고리 등을 만드는가 하면, 갑의지라고 불리는 종이 갑옷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종이 갑옷에는 옻과 송진을 발라 화살이 뚫을 수 없게 하였고, 가벼우며 모양도 보기 좋아서 의장용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한지 원석 주얼리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이진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지는 '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용도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200~300장의 한지를 겹겹이 쌓아 올려 접착한 후 압축하면 한지 원석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석은 주얼리에 활용되는 등 전통 액세서리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또한 과거의 갑의지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한지로 실을 만들어 섬유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지로 의류와 침구류로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양한 제품 중 요즘 시국에 알맞은 상품은 바로 한지 마스크입니다. 최근에는 항균성이 뛰어난 한국의 한지가 보건용 마스크 대용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지는 유해세균 99.9%까지도 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마스크에 비해 피부 자극이 없고 비말 차단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지는 종이라는 가치에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친근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천 년의 내공을 더하여, 지금부터의 천 년이 더욱 기대되는 한지입니다. 다방면으로 커질 한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처럼 한지는 종이라는 가치에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친근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천 년의 내공을 더하여, 지금부터의 천 년이 더욱 기대되는 한지입니다. 다방면으로 커질 한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written by. suri
edited by. suri
ⓒ OROM Co., Ltd